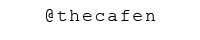언제부터인가 글을 쓰지 않기 시작했다.
비단 블로그 뿐만 아니라, 편지, 일기 등 마침표를 찍어 내려가며 글 다운 내용과 분량을 마지막으로 썼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사실 몇년이 지나고 보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렸던 사진이나 짧은 글보다, 지금 이 블로그에 남아있는 옛 글들, 사진들이 수식없는 나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마치 절필을 선언한 작가마냥 단호하게, 때로는 무서운 개가 지키는 골목을 빙빙 돌아가는 꼬마처럼 블로그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하지만 오랜만에 들어온 블로그는 전과 다름없었다.)
반면, SNS에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고 올렸던 사진이나 글들을 지나고 볼 때면 얼굴이 화끈거릴때가 많다. 사진 속에 있는 모습이나 글 속의 말투는 때로는 본연의 나 라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봐주었으면 하고 만들어낸 허상 같기도 하다. 정말 웃긴 건, 그런 나의 표적(?)이 일관적이지가 않아서 쭉 나열해보면 진중했다가도 상기되어있고, 다정하다가도 냉정해서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를 정도라는 것이다.
오랜만에 과거의 넋두리를 읽으며, 생각에 잠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