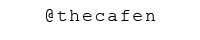차가운 공기.
이맘때 였던 것 같다. 어머니는 막 사망선고와도 같던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선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려는 듯 병원도 가지 않고 한동안 집에 머물렀다. 매일 아침일찍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란스레 밥을 지었고, 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그 때, 마치 암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어머니는 정말 태연하게 행동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암투병을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다.
그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이모께서 찾아오셨다. 이모는 어머니 만큼이나 정 많고 푸근한 인상을 가진 그런 분이셨다. 외할머니를 일찍 여읜 어머니는 나이차이가 많이나는 이모를 어머니처럼 따랐고 이모도 어머니를 딸 대하 듯 아꼈다. 그런 이모가 늦은 오후 추자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안방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분아, 죽는 것도 순서가 있으니, 나 죽을 때 까지 넌 살아야 한다."
참 담담한 말투였다. 슬픔을 기저에 감춘듯 혹은 전혀 슬프지않은 듯 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날 저녁 이모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다. 순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렇게까지 지키셨는지 나는 원망도 했었다. 게다가 이모의 장례를 치르고도 우리 집에는 그 날 이모께서 사오신 롤케잌이 냉장고에 있었다. 우리는 이모가 세상에 없는데도 이모께서 사오신 롤케잌을 오래두고 먹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모의 존재를 망각한 듯 롤케잌에 아무 의미부여없이 참 담담하게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그 날이 지나고서야 시한부선고를 받은 암환자가 되었고, 우리는 엄마와의 이별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렇게.
누군가와의 이별이 차가워진 롤케잌을 먹듯 쉬울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가 바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던, 오늘의 차가운 바람같던 그런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