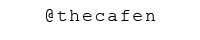|
일년만에 결국 다시 학교다. 다시 그 시멘트 냄새나는 차가운 강의실에서 책상앞에 몇가지의 책을 펴놓고 백묵가루가 완전히 지워지고 않는 칠판을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불과 십대까지만 해도 배움의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몰랐다. 하지만 이십대의 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었고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깔끔하게 정의되지 않는 것들에 의해 나 자신은 표류하고 있었다. 스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보여주기위해 포장하고 싶지 않은 그것은 그저 시간의 진자에 갇혔던 그늘이었다. 한없이 스스로 나태해지며 방관했던 시간들이 내 청춘에 주는 의미는 뭘까 낙천적으로 곰곰히 생각해보자.
iPod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