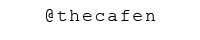#1
언제부턴지 연속성이 없어졌다. 수신상태가 나쁜 수화음처럼 나는 자꾸 끊긴다. 그때마다, 낭떠러지 아래로 던진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처럼, 둔중하고 혼곡스러운 고요가 찾아든다. 나는 이것을 대화의 조건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제는 당신이 말해야할 차례야. 혹은 할말 다했어? 그럼 이제 들어봐 하고 추궁하는 침묵. 침묵은 즐겁다거나, 고요하다거나, 엄숙하다거나 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무채색이다. 무색무취, 깜깜하다거나 어둡다라고 말해지지 않는 어둠. 텅빈 어둠.
차가운 비가 한바탕 지나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명멸하고 있다. 죽은 가수의 노래를 틀어놓고 죽은 화가의 그림을 보는 밤. 노랗고 희미한 빛을 발하는 별들 어쩌면 이미 사라진 별에서 달려오는 것일. 다만 만져지지 않는 사랑. 만져지지 않는 통증. 幻指痛처럼 한때는 나의 살붙이처럼 가까웠던 이름들, 사물들, 그런것들이 모두 너무 멀다. 멀어서 행복하고 멀어서 만지고 싶고 멀어서 너무 멀어서 너는 자꾸 춥지만 나를 껴안고.
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지금 내가 물어야 할 것은 너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부재이다. 네가 했던 말에 대해 내가 화답을 해야 할 차례다. 나뭇잎처럼 바스라질 듯한 소리로 부재의 현장증명. 모든 사라진 것들의 빛에 기대어 너를 부른다.
-별에 기대에 말하다 / 이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