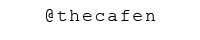|
따스했던 봄이 지났고, 불쾌했던 여름이 지났고, 답지않은 명색의 가을을 보내다 알알이 차가운 빗방울 섞인 가을 공기를 맞는다. 나는 아직도 여름에 생긴 티셔츠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고, 아침에 신문가지러 나갈때의 입김이 낯설고, 가로수에서 떨어져 내 발에 닿는 낙엽과 서먹하다. 스무살 젊은 시절 적었던 일기장에는 마지막 빛을 내는 들녘의 노을보다 더 아쉬운, 그리운, 보고싶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행복했다. 삼년전에도 나는 행복했다. 이년전에도 나는 행복했다. 일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모습은 행복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충분히 행복할 지도 모른다. 아침마다 해야할 일들이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